언어(language)란 무엇인가? '언어를 완전하게 배제한 성찰은 인간의 뇌로는 불가능하다.'
Автор: AI 지성의숲 : 성필원 작가
Загружено: 2 апр.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124 просмотра
이 물음은 한 문장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하고 복합적인 의미망을 담고 있다. 전통 철학에서 오랫동안 언어는 사고의 산물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도구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비트겐슈타인과 여러 사상가들이 언어가 곧 사고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매개이자,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본질적 도구임을 주목하면서, 언어는 철학의 중심 테마로 급부상하였다.
언어는 한편으로는 인지적·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발현되고, 동시에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작동한다. 최근에는 뇌영상 기법, 발달심리학, 인공지능, 계산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언어의 기원·발달·처리과정이 다각도로 조명되고 있다. 이는 곧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언어를 통해 소통하며, 언어를 통해 세계를 해석한다”**라는 명제가 더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과학적·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언어가 현실을 복제할 수 있다는 ‘언어 거울 이론’(복사 이론)을 꿈꿨다. 이는 그의 초기 대표작인 『논리철학 논고』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언어가 현실의 구조를 정확히 ‘그리는’ 역할을 한다면, 참과 거짓은 현실과의 일치 여부로 결정된다." 즉, 철학은 언어를 분석해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일종의 과학이 될 수 있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검증 불가능한 문장은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한 언어’ 구상은 실제 인간의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면이 컸고, 빈 학파가 이를 실현하려고 애썼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 언어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예술·도덕·종교 등 다채로운 삶의 영역을 논리적 검증만으로 환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초기 사상을 대폭 수정했다. 1930년대 이후 그는 **“언어는 삶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펼치는 행위”**라는 통찰로 돌아섰으며, 말년의 『철학적 탐구』에서 이를 정식화했다. "언어는 고정된 ‘논리적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놀이판’이며, 그 의미는 쓰임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언어는 태생적으로 사회적 규칙 속에 존재하며, 개인적·사적인 언어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는 당대 분석철학, 언어철학, 심리학 등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어가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가 진리를 독점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철학은 일상언어의 구체적 사용과 맥락 분석에 새로운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언어가 단지 논리 구조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19세기 뇌손상 사례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뇌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이론에 따르면, 인간 뇌에서는 말하기와 이해가 구분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손상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장애가 생긴다. 이는 언어가 뇌의 특정 시스템을 통해 실현된다는 증거가 되었다.
현대의 뇌영상 기법은 브로카·베르니케 영역 외에도 언어와 관련된 더 복잡한 신경망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언어 처리에는 전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등 여러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며, 맥락·심상·기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발달심리학 연구에서는, 생후 1~2년 무렵 아이들이 소리를 모방하고 단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뇌의 가소성(plasticity)과 결합하여 폭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아울러 노엄 촘스키가 제안했던 '선천적 언어 능력'도, 발달심리학과 진화생물학의 폭넓은 연구를 통해 부분적 지지를 받는 중이다.
최근 **인공지능(AI)과 자연어처리(NLP)**의 비약적 발전은 언어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딥러닝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예: GPT, BERT)은 인간 뇌와는 다른 방식으로 언어 패턴을 학습하지만, 맥락별 단어 예측과 문장 생성 능력에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간 언어 처리의 신경 알고리즘과 기계 학습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인간의 언어 능력을 역설적으로 더 깊이 이해할 단서를 제공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LLM(대규모 언어 모델)이 “인간의 언어능력 일부를 흉내내는가?”, “그렇다면 ‘의미 이해’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 질문도 새롭게 제기한다.
비트겐슈타인 후기 사상이 계기가 되어, 영국의 **오스틴(John L. Austin)**과 미국의 **설(John R. Searle)**은 1950~60년대에 걸쳐 **언어행위 이론(speech act theory)**을 발전시켰다.
문장을 말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화가 성공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거나, 때론 오해를 낳기도 한다.
이전에는 참·거짓 중심으로 접근했지만, 이제 발화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예: 약속, 명령, 결혼 서약, 사과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 흐름을 **‘분석철학**이 계승·발전시키면서, 20세기 후반 철학계에 중요한 조류로 자리 잡았다. 분석철학자들은 “언어가 사고와 세계 이해에 어떤 틀을 제공하는가?”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었고, “철학적 난제들의 상당수가 언어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독일 대륙철학 전통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내 존재(Dasein)’로 파악했고, 제자인 가다머는 이를 “인간은 언어 내 존재”로 확장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계 속에 던져져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며, 세계와의 관계가 선험적이고 실존적이라고 보았다.
가다머는 여기서 나아가 “인간이 세계를 갖는 방식은 언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즉, 언어 없이는 인간적 삶을 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상학자인 메를로퐁티 또한 언어와 사고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전통적 인식에 반대했다. 그는 “언어가 발화됨으로써 사고가 비로소 실현된다”고 보았다.
“말하기 전에 이미 완성된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언어행위)을 통해 사고가 만들어진다.”
이는 곧, **“언어가 사고의 신체와 같다”**는 관점을 시사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기 세계를 구성하고, 다른 이와 교류하며, 스스로도 변화한다.
언어는 점차 ‘멀티모달(다중양식) 의사소통’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늘고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 표정, 시각적 기호 등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가 사회적 삶의 도구임을 강조했다면, 최신 연구는 여기에 **‘비언어적 요소’**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도 적극적으로 분석한다.
인간과 기계가 점점 자연어로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언어철학의 오래된 물음이 AI라는 새로운 장에서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다.
“기계가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계가 생성한 텍스트가 ‘의미’를 지니는가?”
이는 곧 비트겐슈타인의 화두였던 ‘사용’, ‘맥락’, ‘의사소통’, ‘의미’ 등의 개념을 다시금 검토하게 만든다.
언어와 사고는 분리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사고(의식)가 선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5회] ‘선택적 월권’과 재판관 ’알박기’ (25.04.27)](https://ricktube.ru/thumbnail/e5YYzZbxZbM/mqdefaul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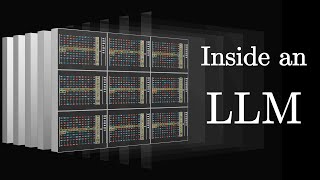
![[다시보기] 뉴스룸|파면과 함께 시작된 카운트다운…윤 '빠듯한' 공소시효 살펴보니 (25.4.27) / JTBC News](https://ricktube.ru/thumbnail/HMSARnaTtiI/mqdefault.jpg)

![[고수다] 박지원](https://ricktube.ru/thumbnail/S7pjCVY_268/mqdefault.jpg)
![[현대철학 필수지식!] 언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위대한 철학자 - 비트겐슈타인](https://ricktube.ru/thumbnail/yAALHSE_usQ/mqdefault.jpg)
![5 Pieces by Hans Zimmer \\ Iconic Soundtracks \\ Relaxing Piano [20min]](https://ricktube.ru/thumbnail/Os47nMrjw_Y/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