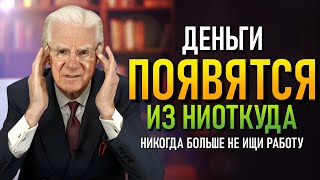48강 육바라밀(六波羅蜜),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수행법, 보시와 인욕은 대사회적인 것으로서 이타적인 대승불교 ...
Автор: 진지아롱TV
Загружено: 9 дек. 2022 г.
Просмотров: 353 просмотра
48강 육바라밀(六波羅蜜) 육바라밀(六波羅蜜)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행이다.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수행법인 육바라밀은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등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시불교에서는 불제자(佛弟子)로서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으로 충분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살의 수행법으로서 팔정도를 채택하지 않고 육바라밀이라는 독자적인 수행법을 설하였다.
그것은 팔정도가 자기완성을 위한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타(利他)를 위하여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시와 인욕과 같은 대사회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육바라밀이 보살의 수행법으로 알맞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육바라밀의 수행법에서 보시를 제일 먼저 둔 까닭도 사회의 모든 사람이 상호협조적인 보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대승불교로서는 가장 필요한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육바라밀에는 팔정도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외에 팔정도에 없는 보시와 인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만은 대사회적인 것으로서 이타적인 대승불교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보시(布施)는 재시(財施)·법시(法施)·무외시(無畏施)의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재시는 자비심으로서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물건을 주는 것이고, 법시는 다른 사람에게 부처의 법을 말하여 선근(善根)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무외시는 스스로 계를 지켜 남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이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 주는 것이다.
지계(持戒)는 부처가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설정해 놓은 법규를 지키고 범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 가지가지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살찌게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불제자는 반드시 오계(五戒)를 받아야 한다. 다섯 가지 계율(戒律)이란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婬),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를 말한다.
인욕(忍辱)은 온갖 모욕과 번뇌를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안주하는 것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인 성나고 언짢은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 인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복인(伏忍)으로,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먼저 성나는 그 마음을 조복(調伏)하여 억누르는 것이다. 그러나 역경만 참아서는 안 되며,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순경(順境)도 참아야 한다. 그 이유는, 역경을 참지 못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투쟁하기 쉽고, 순경을 참지 못하면 유혹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유순인(柔順忍)으로, 사람이 참기를 많이 하면 저절로 조복이 되어서 역경이나 순경을 만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셋째 무생인(無生忍)으로, 참고 견디어 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람의 인욕행이다. 인생이 무상하며 세상이 허황함을 깨닫고 일체만법(一切萬法)이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진리를 깨닫고 보면 별로 성낼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다는 것이다.
넷째 적멸인(寂滅忍)으로, 이것은 부처의 지위에 있어서의 인욕행이다. 생사고해에 뛰어나서 본래부터 적멸한 열반의 경지에 서서 볼 때 한 물건도 없는 경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욕행을 닦음이 아니라, 본래부터 한 생각도 일으킴이 없는 곳에 참된 인욕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진(精進)은 순일하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닦는다는 생각과 닦을 일이나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精)은 순일무잡(純一無雜)을 의미하고 진(進)은 용맹무퇴를 말한다. 이 정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과 입으로써 부지런히 착한 일을 닦고 배우며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무르게 하여 모든 생각이 착한 진리를 떠나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사정진(事精進)과 이정진(理精進)이 있는데, 사정진은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막론하고 그것을 한번 이루려고 결심하였으면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진은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이 이롭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거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기어이 성취하도록 노력,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정(禪定)은 수행인이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하여 마음을 닦는 것이며, 생각을 쉬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생활이 불만과 고통으로 가득차게 되는 까닭은 잡다한 생각을 쉬지 못하고 어리석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로서 망념과 사념과 허영심과 분별심을 버리게 한다.
반야(般若)는 지혜라고 번역한다. 모든 사물이나 이치를 밝게 꿰뚫어 보는 깊은 슬기로서 지식과 다른 점은 지식이 분별지(分別智)인 데 반하여 지혜는 무분별지이다. 보살이 피안에 이르기 위하여 수행하는 육바라밀 중 마지막의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의 어머니라 하며 다른 5바라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반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
① 문자반야(文字般若)는 부처님이 설한 경(經)·율(律)·논(論)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고, ② 관조반야(觀照般若)는 경·율·논의 문자반야를 통하여 진리를 알아내고 진리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③ 실상반야(實相般若)는 부처가 체득한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십바라밀(十波羅蜜)
이상의 육바라밀을 보살이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함으로써 성불하게 되는데 육바라밀에 방편(方便), 원(願), 역(力), 지(智)의 네 가지 바라밀을 추가하여 십바라밀(十波羅蜜)이라 한다.
방편(方便)은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원(願)은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을, 역(力)은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을, 지(智)는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 네 가지 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분화되어 생겨난 것으로 각자의 독자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방편의 방(方)은 방법이고 편(便)은 편리로서 수행에 이르는 방법과 수단을 편리하게 쓰는 것이다. 한마디로 편법을 쓴다는 것이다. 즉 아직 부처님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衆生)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講究)하는 것이다.
원(願)은 바란다는 뜻으로 바라는 것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희망인 서원(誓願)이다. 이 원에는 ① 처음으로 진리를 갈구하며 발심하는 발심원(發心願), ② 미래세(未來世)에 출생하여 중생을 선도하고 두루 이익되게 하겠다는 수생원(受生願), ③ 모든 진리를 올바로 사유하고 참다운 지혜로써 간택하며, 뛰어난 공덕(功德)을 쌓아 중생을 교화하겠다고 결심하는 소행원(所行願), ④ 일체의 진리와 보리(菩提)의 공덕을 포섭하고 수용하겠다는 정원(正願), ⑤ 정원에서 더욱 나아가 법과 중생을 위하여 몸을 바치겠다는 대원(大願) 등이 있다.
역(力)은 몸과 마음을 요란하게 하여 선법(善法)을 방해하고 좋은 일을 깨뜨려 수도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막는 힘을 뜻한다. 이 역에는 사택력(思擇力)과 수습력(修習力)이 있다. 사택력은 지혜로써 사물을 진리롭게 생각하며 실천하는 힘이고 수습력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정진력을 뜻한다.
지(智)는 결단을 의미하며, 모든 사상(事象)과 도리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삿되고 바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지는 혜(慧)의 여러 가지 작용의 하나이나 지혜라 붙여 쓴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세계의 참뜻을 지를 얻는 데 있다 하고, 불과(佛果)에 이르러서도 지를 주덕(主德)으로 한다.
이 십바라밀은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 이래 유가법상종(瑜伽法相宗)과 화엄종을 중심으로 그 실천이 크게 강조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선(禪) 중심의 불교에서 육바라밀만을 중심으로 채택하게 됨에 따라 나머니 네 가지 바라밀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다.*
#육바라밀#사성제#팔정도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