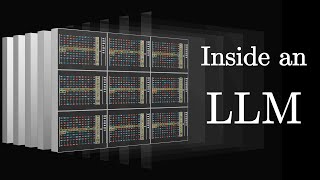남인과 북인, 정철과 기축옥사, 정여립과 대동계, 건저파동과 이산해, 당파싸움,
Автор: 동반TV-인생극장-명장면(일화, 교훈)
Загружено: 26 окт. 2024 г.
Просмотров: 376 просмотров
정여립의 난으로 인한 기축옥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1591년 3월경 선조의 후계자인 세자를 세우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산해와 좌의정 정철, 우의정 류성룡은 광해군을 세자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광해군은 선조와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위로 친형인 임해군이 있었다. 그러나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하여 세자 물망에서 일찌감치 탈락했다.
선조의 총애를 받던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고 2년 후인 1577년 산후병으로 죽었다. 이후 인빈 김씨가 신성군과 정원군을 낳고 선조의 총애를 독차지했다.
1591년 당시 임해군은 19세, 광해군은 16세, 신성군은 13세, 정원군은 11세였다.
당시 선조의 나이는 39세였고 왕후였던 의인왕후 박씨는 36세였으나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영의정 이산해는 선조가 인빈 김씨를 총애하는 것을 알았다. 그런 상태에서 인빈 김씨의 아들이 아닌 광해군을 세자로 추대하면 선조가 분노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산해는 기축옥사를 처리할 때 정철이 동인 백정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동인을 국문 중에 죽게 한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산해는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밀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정철을 실각시킬 계획을 짰다. 이산해는 토정비결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이지함의 조카로 전략적인 인물이었다.
이산해는 은밀히 인빈 김씨의 오라비인 김공량을 찾아갔다. 그리고 “정철이 몰래 광해군을 세자로 세울 계획을 꾸미고 있소, 나아가 인빈 김씨와 신성군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소”하고 전했다.
당시 기축옥사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정철이 자신들의 목숨을 노린다는 말을 전해 들은 인빈 김씨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선조에게 자신과 신성군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선조는 인빈 김씨의 말을 듣고 정철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세 대신은 광해군을 세자로 추대하기로 하고 선조에게 알현을 신청했다. 이때 이산해는 병을 핑계로 입궐하지 않았고 정철과 류성룡이 왕을 알현했다.
그 자리에서 성질이 급한 정철이 먼저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건의했다.
이미 인빈 김씨에게 얘기를 듣고 선입견을 갖고 있던 선조는 불같이 화를 냈다. 류성룡은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모든 화살은 정철에게 쏟아졌다.
당시 정철이 기축옥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동인이 연루되어 동인의 세력이 위축되고 서인의 세력이 커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선조로서도 세력 균형을 모색하고 있었다.
때마침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정철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조정의 기강을 무너트렸다고 탄핵했다. 그러자 선조는 정철을 파직하고 강계로 유배시킨 후 위리안치까지 시켰다.
위리안치(圍籬安置)는 중죄인에 대한 유배형 중의 하나이다. 이는 죄인을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귀양 간 곳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돌리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두는 것이다. 그 정도로 정철은 위기에 몰렸다.
선조는 정철에게 모함받아 쫓겨났던 동인들을 복귀시켰다.
1591년 8월경에는 동인의 지도자였던 최영경을 무고했던 양천회가 모진 고문을 받은 후, 정철이 시켜서 최영경을 무고했다고 자백했다.
정철에게 최악의 위기가 닥친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더 이상 일을 확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귀양갔던 정철은 복귀하였고 1593년 병사한다.
정철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 수많은 작품을 남긴 문학의 대가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괴팍했다.
정철의 지나친 음주를 걱정한 선조는 은으로 만든 잔을 하사하며 “이 잔으로 하루에 한잔 만 마셔라”하고 지시했다. 그러자 정철은 술잔을 망치로 두들겨 술잔의 크기를 키워서 마셨다.
이러한 정철이 기축옥사의 조사를 주관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들까지 고문을 가해 죽게 하는 등 동인들을 탄압하여 동인 백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기축옥사의 원인을 제공한 정여립은 매우 총명하고 언변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정여립은 과거에 합격한 후 이이와 성혼의 문하를 드나들며 학업에 정진했다. 정여립은 이이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여립은 이발과 친분을 쌓더니 점차 동인의 세력과 가까워졌다.
그러다가 이이가 세상을 뜨자 정여립은 아예 동인이 되었다. 정여립은 서인을 비판하고 자신을 후원해 주고 키워 주었던 이이까지 싸잡아 매도했다.
평소 이이와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던 정철은 정여립의 배신과 그를 조장한 이발에 대하여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것이 정여립의 난에 대한 조사에서 정철이 이발에게 가혹한 국문을 가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정철은 명확한 증거보다는 단순히 정여립과 서신 교류를 했거나 정여립에게 동정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옥사를 확대했다.
김빙 같은 인물이 하나의 예다. 김빙은 찬바람을 쐬면 눈물을 흘리는 체질이었다. 그런데 선조는 이미 자결한 정여립의 시신을 거열 하며 문무백관이 관전하도록 했다.
하필 그때 찬바람이 불자 김빙은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정철은 김빙이 정여립과 필시 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문을 가해 죽였다.
이러한 과한 행동이 정철에 대한 분노를 키웠다. 그래서 정철이 실각된 후 정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동인은 정철을 살려두어야 한다는 남인과 정철을 죽여야 한다는 북인으로 나뉜 것이다.
남인과 북인이라는 말은 온건파인 남인의 대표 인물인 우성전이 남산 밑에 살고 강경파인 북인의 대표 인물인 이발이 북악산 아래에 살아서 유래한 것이다.
즉 남인과 북인이라는 말은 정철 사태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정철 처리 문제로 보다 명확하게 부각된 것이다.
최영경은 조식 문하의 지도자로 정철을 소인배라고 칭했다. 정철은 최영경을 정여립의 난에 관련된 길삼봉이라고 의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최영경은 감옥에서 죽었다.
최영경이 정여립이 주최한 활쏘기 모임에서 정여립보다 상석에 앉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를 토대로 길삼봉은 필시 최영경일 것이며 실질적인 역모의 몸통도 최영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문을 받은 것이다. (길삼봉은 정여립의 배후세력으로 알려진 미스테리한 인물이었다.)
한편 정철이 최영경을 감옥에서 죽게 한 것이 조식 문하 사람들에게 깊은 원한을 심었다.
동인들은 정철을 처형할 것인가를 두고 분열했다. 정인홍을 중심으로 하는 조식의 제자들은 정철을 처형해야 한다는 강경파로 북인을 결성했다. 그리고 류성룡을 중심으로 하는 이황의 제자들은 정철을 처형하지 말자는 온건파로 남인을 이루었다.
이후 남인이 정국을 주도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날, 임진왜란 발발과 타협적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류성룡은 탄핵을 받고 물러났다.
권력을 잡은 북인은 광해군을 왕으로 미는 대북과 영창대군을 왕으로 미는 소북으로 나뉘게 된다.
광해군 시대에는 대북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에 북인은 사실상 명맥이 끊기고 남인과 일부 소북만이 남게 되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정철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나친 권력 남용으로 정철은 위기를 맞는다.
사람은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의 원한을 사는 행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과 행동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결국 자신을 위한 배려가 될 것이다.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1회] 다섯 종류의 한국 사람 /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https://ricktube.ru/thumbnail/ocxH0Hv42No/mqdefault.jpg)
![[조선24] 정 여 립 / 시대를 너무 앞섰는가? 반역의 대명사인가?](https://ricktube.ru/thumbnail/uvboiGHzgYU/mqdefault.jpg)
![[박종인의 땅의 역사] 131. 1000명 선비 학살극 몸통, 선조: 1589년 기축옥사와 '역적의 문서'](https://ricktube.ru/thumbnail/E42wIJLGQsU/m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