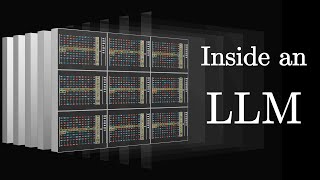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공리주의’
Автор: 『인문교양심리철학』: 성필원
Загружено: 5 июл.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274 просмотра
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의 사상을 이어받아 ‘공리를 모든 가치의 원리’로 보는 공리주의를 신봉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쾌락 행복을 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기 마련인데, 인간의 어떤 행위가 행복을 촉진한다면 그것은 바르고 행복과 반대된다면 그른 것이 된다. 다만 이것이 벤담처럼 한낱 개인에 그쳐서는 안 되며,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밀은 벤담이 쾌락의 양을 중시하는 것과 반대로 그 질을 중요시했다. 여기에서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다. 즉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던 것이다.
공리주의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그 행동의 결과가 인간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견해다. 이 이론은 조지프 프리스틀리와 로크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공리주의 옹호자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다. 벤담과 밀 중 누구의 논문이 더 훌륭한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밀의 『공리주의』가 선정되었다는 것이 신경에 거슬릴지도 모른다. 밀의 연구가 단지 벤담의 통찰을 재작업하고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밀이 그 이론을 더 발전시켰으며 벤담의 저서보다 풍부한 내용을 자신의 해설에 담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벤담의 저서가 선정되지 않아 기분이 상한 사람들을 위해, 우선 벤담의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벤담과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밀을 고찰하는 작업에서 벤담을 빼놓는 일은 지적인 오류일 뿐 아니라 옳지 않다. 벤담은 한마디로 무시하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뛰어나다. 그는 철학과 법 이론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이동주택과 난방 시스템, 냉장 장치, 위조 방지 은행권, 콩을 얼리는 계획, 다수의 수감자를 소수의 간수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유명한 원형 감옥 ‘파놉티콘’등을 고안했다. 게다가 벤담은 셰익스피어처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은 어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또한 벤담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영감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사후에 자신의 시신을 박제로 만들어서 전시해 놓을 계획까지 마련해 놓았다. 이는 ‘오토아이콘’이라 불리는데, 현재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전시되어 있다. 이런 벤담의 원칙 때문에, 그의 추종자인 철학적 급진주의자들은 동물, 동성애, 참정권, 소유권, 조세 제도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해 삶을 개선하고자 했다. 벤담은 확실히 여러 방면에서 매우 뛰어났다. 행복의 본성을 설명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외하겠는가?
벤담이 철학에 크게 기여한 바는 합리성을 윤리와 입법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 점이다. 벤담의 시대에는 법에 따른 처벌이 합리적인 원리가 아니라 기만과 허구에 기초를 둔 모습이었다. 특히 얼마나 가혹한 처벌이 주어지느냐는 그 죄가 입법자의 기분을 얼마나 상하게 했느냐에 달려 있었다. 더 나아가 벤담은 ‘해야 한다’, ‘옳다’, ‘그르다’ 등의 말에는 명확한 의미가 없다고 했으며, 법안조차도 명백하고 이성적인 표현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복잡함과 도덕적 언어의 혼동을 불러왔던 불합리함과 편견을 단 하나의 원칙으로 극복한다. 이 원칙이 ‘공리의 원리’이며, 다른 말로 ‘최대 행복의 원리’다. 벤담은 ‘최대 행복의 원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힌다. “최대 행복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의 경향에 따라 매번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최대 행복의 원리와 그에 의존하는 행복의 개념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를 둔다. 벤담은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주인을 섬긴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행복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 곧 쾌락에서 고통을 뺀 몫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회에서 인간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일이란, 그 공동체가 느끼는 쾌락에서 고통을 뺀 전체 몫이 증가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도덕성이 있다. 공리의 원리에 부합되는 행동, 즉 고통보다 쾌락의 전체 양을 증가시키는 행동이라면 행해야 하며, 그런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고민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어떤 방법으로 쾌락과 고통의 ‘무게’를 재고 그 차이 값을 계산해서 행동할 것인가? 어떤 행동보다 행복을 더 줄 것 같은 대안적인 행동 방침들이 여럿 떠올랐다고 해도, 그 중 어느 것이 지금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가장 많이 늘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돈을 자선사업에 기부하는 일과 친구들과의 점심식사에 쓰는 일 중, 어느 것이 얼마나 더 많은 쾌락을 줄지 어떻게 계산할까? 한마디로 쾌락과 고통은 계량화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배가 부를 때 얻는 쾌락이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아이들이 고통을 작게나마 없애는 것보다 가치가 작을까? 벤담은 이에 대한 답으로 ‘쾌락주의의 계산법’이라는 의사 결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쾌락과 고통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식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벤담은 쾌락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는가?
.........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공리주의’](https://ricktube.ru/thumbnail/lsf0Apr7mPo/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마이클 샌델은 좌파? [정의란 무엇인가] 핵심 요약과 마이클 샌델의 사상!](https://ricktube.ru/thumbnail/80TIm2c1Pnw/mqdefault.jpg)